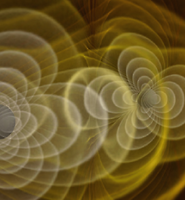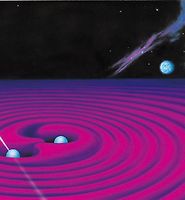마음 |
알파고가 바둑에서 승리를 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하고 있습니다. 터미네이터가 떠오르고, 호킹박사를 비롯한 천재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지배당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정재승 박사는 아직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하네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번 알파고가 파란을 일으킨 것은 인간의 뇌를 흉내 낸 '약한 지능', 다른 말로 '딥 러닝' 이라는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컴퓨터의 인공지능은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듯이 "주어 다음에는 동사"가 오고... 어쩌구 하는 문법을 가르치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이 방법으로는 컴퓨터가 결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딥 러닝은 빅데이타를 근거로 합니다. 무수히 많은 데이타를 제공함으로써 확률적으로 가장 가까운 답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사진의 얼굴에 태그를 달면 달수록 컴퓨터는 학습을 하게 되고, 이제는 90% 이상의 확률로 사진만 보고 그 사람을 알아보는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스카이프를 통한 수 많은 대화를 통해서 컴퓨터는 질문에 대한 가장 적당한 답을 공부해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개와 고양이는 쉽게 구분이 되지만 컴퓨터는 아직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개와 고양이의 데이타를 제공하면 거의 정답에 가깝도록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학습을 합니다. 쉬지 않고 공부를 하지요.
결국 인간의 학습하는 방식을 컴퓨터에게 적용하자 알파고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언제 컴퓨터가 자아를, 그러니까 '강한 인공지능'을 갖게 될까요?
정재승 박사는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자아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우리 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컴퓨터에게 학습시킬 방법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인공지능에게 학습 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딥 러닝으로 강화된 '약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무섭게 대체하는 현실을 보면서 인공지능의 출현이 인간에게 축복이 될지, 위협이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마음 > 아주 보통의 과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공지능과 로봇윤리 (0) | 2016.03.29 |
|---|---|
| 중력파의 검출이 뭐길래 난리 일까요? (0) | 2016.02.23 |
| 아인슈타인의 100년 전 예언, 중력파는 관측되었을까? (1) | 2016.02.16 |
| 팟캐스트 열어 보기 - 극우와 보수는 다른가? (0) | 2015.11.20 |
| 기사 열어 보기 - 평등과 복수에 관한 인간의 본능 (0) | 2015.09.22 |
![]()